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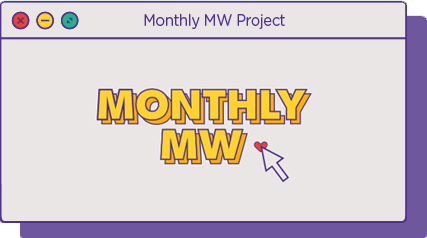
2021. 2. 22. 00:13
왕관을 머리 위에 둔다는 것은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됨과 동시에 모두가 등을 돌려버린다는 의미였다. ‘왕’이라는 것은 그런 자리였다. 언제든 위협을 받아도 어색하지 않은 오히려 그것이 더 자연스러운 상황이라 설득되는 그런 것이었다. 모두 민규의 이야기였다. 왕좌에 오른 지 두 해째. 그는 하루라도 편히 잠에 든 일수가 손에 꼽을 정도였다. 밀린 정사에 밤을 지새우고, 정권싸움에 휘말려 밀려오는 잠도 마다한 채 제 허벅지를 꼬집어야 했다. 그 시간 속에서 민규는 끊임없이 소리쳤다. 제발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허망한 바람은 언제나 민규를 허탈하게 할 뿐이었다.
민규는 지새우는 밤이 괴로워 언제부터인가 홀로 궐을 나서기 시작했다. 딱히 어딘가를 찾아가거나 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저 일말의 자유로움이라는 것을 느끼기 위함이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늘 속박 당하는 삶이 본인 스스로도 안쓰러웠다. 그런 그의 삶에 그 잠깐의 시간은 제 괴로움에 대한 보상으로서 민규를 보듬어주었다.
거친 흙길을 오르는 민규의 발걸음은 힘이 없으면서도 당찬 발걸음이었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 찾은 곳, 이름 없는 골짜기였다. 저를 노리는 벼슬아치도, 저를 감시하는 군인들도 없는 곳이었다. 오로지 밤하늘을 빼곡히 채운 별들과 흐르는 물소리, 찌르르르 울리는 풀벌레 소리가 전부였다. 그는 제 옷이 상하는 것도 인지하지 못한 채 큰 바위 위에 걸터앉았다. 꽉 막혀있던 숨을 내쉬었을 때, 민규의 입가엔 조그마한 호선이 그려졌다. 마치 자신이 아무 것도 아닌 사람이 된 것만 같아서, 정말 평범한 한 사람이 된 것만 같아서.
어찌 이 당연한 것이 이리도 행복한 것이 되었단 말이야. 방금 뱉어진 한숨과도 같이 뱉어진 말은 별이 있는 방향으로 흘렀다. 차갑지도 무덥지도 않은 새벽의 공기가 그 흩어진 단어들을 감싸고돌았다.
그 조금의 자유를 얻은 그는 그 날 이후로 꾸준히 그 골짜기를 찾아 발걸음 했다. 그곳에서 느끼는 그 평범한 시간이 왜인지 그가 지금껏 갇혀있던 구속을 풀어버리는 기분이었다. 해가지고 달이 뜨고 별이 흩어지는 시각, 민규는 또 다시 옷을 챙겨 입었다.
골짜기로 향하는 그는 이질적인 감각을 느꼈다. 평소와는 다른 공기의 흐름이었다. 마치 이 공간에 저 혼자가 아닌 듯한 그런 기분이었다. 괜히 제 허리춤에 차여진 검을 쥐어 잡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누굴까? 단 하나의 질문만이 민규를 가득 채웠다. 그리고 이윽고 부스럭 거리는 쪽으로 검을 뽑아들었다. 누구냐! 그리고 그곳에서 고양이 눈을 하고 놀란 아이와 마주했다. 아이는 검을 보고 놀란 것인지 눈가를 적시고 있었다. 민규는 그저 아이인 것에 안심하고는 검을 거두었다.
어찌 이런 늦은 시각에 이곳에 있는 것이냐? 민규의 질문에 아이는 되물었다. 그러는 나리께서는 이 늦은 시각에 이곳에 어찌 계십니까? 검에 놀란 아이치고는 꽤나 당찬 반문에 민규는 그만 말문이 막혀버렸다. 아이는 민규가 별 행동을 취하려는 의사가 없어보이자 민규를 지나쳐 그가 앉아있던 끄트머리에 자리 잡았다. 편하게 자리 잡은 아이는 민규에게 손짓했다. 민규는 그에 이끌려 아이의 옆자리에 앉았다. 별들로 얼룩진 하늘이 다시 봐도 참으로 예뻤다.
너는 이곳은 어찌 알고 온 것이냐? 민규는 옆에 앉아있는 아이에게 질문했다. 그저 길을 잃어 집을 찾다 발견한 곳입니다. 민규는 이어지는 대화 없이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지요? 이곳에 오면 왜인지 저임에도 제가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별들이 금방이라도 제 위로 한가득 쏟아질 것만 같고, 어두운 밤하늘을 헤엄치는 구름도 손만 뻗으면 닿을 것만 같습니다. 꿈만 같은 곳이지요. 저는 가끔 이곳에 와 그저 그림 같은 이 장면을 눈에 담습니다. 해가 떠있을 때는 마주하지 못할 아름다움이 가득이니까요. 나리께서도 그런 마음으로 이곳에 발걸음 하시는 게지요?”
민규는 한참을 아이를 바라보다 입을 열었다.
“처음 이곳에 도달했을 때는 등에 식은땀이 가득했지, 길을 잃은 것일까. 혹여 산짐승을 만나지는 않을까. 허나 그런 걱정은 금방 가시더구나. 밤하늘을 마주친 까닭이었지. 한참이나 바라보았다. 그 아름다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리는 기분이 들어서. 굳이 마음 쓰지 않아도 내 발걸음은 나를 이곳으로 이끌더구나. 오로지 이 시각에 정말 나를 자유롭게 하는 곳이었으니, 참으로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들을 이곳이 되살려주었지.”
“그것이 어떤 것인지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편안하고, 자유롭고, 평범한 것들이지.”
“어찌 그것들을 잊고 사셨단 말입니까?”
“나는 편안할 수도, 자유로워서도 아니 되는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니 그런 것이지. 아무튼 이곳은 나에게 그런 곳이다. 나를 평범한 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곳.”
“나리는 참으로 갇혀있는 분이십니다.”
“어찌 그리 말하느냐?”
“편안할 수 없다면 편안한 곳으로 가면 될 것이고, 자유로워서는 아니 되면 속세를 벗어던지면 평범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 된다면 참으로 꿈만 같겠구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맑게 웃으며 말하는 아이에 민규는 덩달아 웃었다. 때 묻지 않은 아이구나. 민규는 손을 뻗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름이 무엇이냐? 민규의 물음에 아이는 당차게 답했다. 둥글 원에 도울 우를 씁니다. 좋은 이름이구나. 민규는 그 밤이 지난 이후로 매일 밤 골짜기로 향했다. 하는 것은 늘 같았다. 홀로 별들이 가득 얼룩진 밤하늘을 바라보거나, 다시 만난 원우와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것. 민규는 이미 그것들에 만족했다. 원우는 참으로 신기한 아이였다. 안면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저 같은 곳 같은 시각에 만나 그저 이야기를 나누는 것뿐임에도 이미 두터운 유대감이 만들어진 것만 같았다.
“고을이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것이냐?”
민규는 원우에게 물었다.
“그리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곳에 있습니다.”
“허면 이곳에 오는 것이 그리 순탄치 않다는 것이로구나.”
“다른 말로는 그리 힘들지 않았다는 말도 되지요.”
“그래 그렇게도 되겠구나.”
“나리께서는 어떠십니까? 고을이 이곳에 먼 곳에 있으셔요?”
“나는 그것을 생각하며 이곳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다 할 답을 주지 못하겠구나. 허나 이곳에 올 기대감에 그 길이 멀어도 멀지않다고는 해두마.”
“나리께서는 참으로 신기하셔요”
“무엇이 그리 신기하더냐?”
“가난한 제 눈에도 이리 비싸고 고운 비단을 걸치시고는 이런 밤하늘을 보며 비단에 흙이 묻는지도 모르는 선비님을 처음 뵈어서요. 적어도 제가 보는 선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빛나는 별보다 빛을 내는 기방에 걸음하시거든요.”
“거 참 부끄러운 행세들이로구나.”
“그래서 나리가 신기합니다. 다른 선비님이랑은 다르게 느껴지니까.”
민규는 저는 바라보는 원우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그림과도 같은 풍경에 스며들었다. 마치 같은 그림 속에 존재하는 이들이 된 것처럼 서로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별들이 하나하나 새겨졌다. 점점 더 어두워지는 밤하늘에도 서로를 바라보는 둘의 마음에도 형형색색의 별은 피어났다.
“너도 참으로 신기하구나.”
“이유를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나는 늘 사람을 경계해야하는 삶을 살았고, 앞으로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허나 너는 왜인지 경계할 수가 없어. 그 연유를 알 수가 없다. 그저 속에 있는 말들이 막을 새도 없이 제 존재를 드러내고, 감정 또한 내 말을 듣지 않아. 그러니 내게 너는 참으로 신기한 아이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긴 나리랑 저는 이번이 두 번째 만남이니 그럴 만도 하지요.”
“그리고 내게는 앞으로의 만남이 기대되는 이 또한 없었지. 한데 너와는 계속 마주하고 싶고, 이리 이야기를 나누고 싶구나. 깊은 대화가 아니더라도, 상투적인 뭐 그런 것 말이다.”
“어려울 것 없지요. 그저 걸어서 걸어서 이곳에 오면 되는 일이 아닙니까? 제가 말동무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합니다. 뭐, 앞으로 말동무 없는 나리 한 분 건사한다 생각하고 제가 말동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이것 참 몸 둘 바를 모르겠구나?”
민규와 원우는 어둡고 반짝이는 그 그림 안에서 호탕하게 웃었다.
“허면 해가 두 번 저물어갈 때 한 번씩 이리 만나자꾸나.”
“예, 좋습니다.”
“달보다 별들이 더 반짝이는 것을 보아하니 이제 나도 돌아갈 때가 된 것 같아. 그만 일어나야겠다.”
“그럼 두 번째 밤에 뵙겠습니다.”
내일을 기대하게 하는 것, 시간이 흐르는 것을 반갑게 해주는 것, 평범한 것을 반짝이게 해주는 그것은 사소한 것이며, 거창한 것이다, 동시에 그것은 행복이며 행운이었다. 같은 날 밤, 어느 골짜기에서 두 사람은 행복이자, 행운이며, 동시에 사소하면서도 거창한 것을 얻었다. 그것이 어떤 감정으로 도출될지, 또한 어떤 형태로 자라날 지는 그 누구도, 심지어는 그 두 사람마저도 모르는 일일 것이다. 하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지금 두 사람은 행복할 내일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 그것 하나뿐이다.
풀벌레가 찌르르르하고 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