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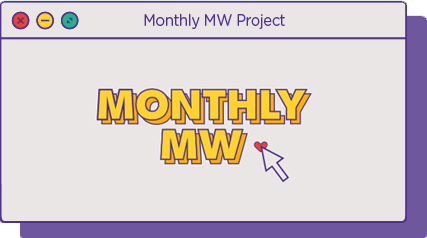
2021. 1. 10. 01:40
김민규랑 영화를 찍게 되었다. 그렇게 붙어 다니면서 아직까지 작업을 안 해본 게 더 신기하다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 하지만 나는 그래서 더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김민규랑 어떻게 같이……. 나와 김민규는 영화과에 재학 중이다. 나는 시나리오를 쓰거나 연출을 하고, 김민규는 연기를 한다. 우리는 매일 같이 다닌다. 사실 내가 가는 길에 김민규가 따라 다니는 쪽이 더 가깝다. 원우야, 어디야? 막 김민규 목소리가 귀에 떠다니는 것 같다. 김민규가 나를 좋아하는 거 아니냐고 우스갯소리로 다들 그러지만, 절대 아니다. 김민규는 나한테 마음이 없다. 그게 제일 짜증난다. 안 그래도 어떤 시나리오로 작업을 해야 할 지 머릿속이 새하얀데, 그걸 연기 할 사람이 김민규라니. 미칠 노릇이다. 김민규는 나랑 같이 영화 찍는 게 좋은지 개새끼마냥 계속 앞에서 실실 웃고 있다.
“좋냐?”
“엉. 좋다. 우리가 드디어 같이…!”
“나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어, 뭐라고? 꼭 이런 말만 못 듣는 김민규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을 되묻는다. 됐어, 꺼져. 나 집 간다. 나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난다. 아, 원우야아! 그럼 김민규가 내 이름을 애타게 부른다. 내가 원래 예민한 사람이긴 하지만, 김민규에게 유독 까칠하게 구는 이유는 정말 단순하다. 내가 김민규를 좋아한다.
김민규와 내가 처음 만난 건, 개강 전 신입생 환영회 자리였다. 나는 그 겨울에 지독한 독감에 걸려버렸다. 그래서 코를 훌쩍거리며, 감기는 눈을 겨우겨우 뜬 채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덥고 밀폐된 공간에 오래 있어서인지, 자꾸 얼굴에서 열이 나고 머리가 핑핑 돌았다. 나는 술집 앞에 쪼그려 앉아 찬바람을 쐬었다. 아, 진짜 죽겠다. 조금 괜찮아지는 가 싶더니, 옆에서 바람을 타고 오는 담배냄새에 나도 모르게 표정을 찌푸리며 담배 피는 사람을 쳐다봤다. 그 사람은 키가 너무 커서 고개를 한참 올려다 봐야했다. 담배연기인지, 입김인지 모를 것을 뿜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눈이 마주쳤다.
“…아, 담배. 미안.”
“…아냐.”
김민규였다. 내가 너무 무안을 준건 아닌지, 민망한 표정으로 재빨리 담배를 발로 지져 끄는 모습에 괜히 미안해졌다. 그렇게 우리는 한동안 찬바람을 맞고 있었다. 김민규는 제 운동화로 애꿎은 아스팔트 바닥을 갈았고, 나는 어지러운 머리를 벽에 기댔다.
“괜찮아?”
“어, 괜찮아….”
갑자기 말을 걸어오는 탓에, 얼굴을 느릿하게 돌렸다. 문득, 내 얼굴이 너무 멍청해보여서 비웃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됐다.
“전원우, 맞지?”
“내 이름 알아?”
“넌 내 이름 몰라?”
“알지, 김민규….”
“예쁜 애가 내 이름 안다고 하니까 기분 좋다.”
김민규는 처음부터 또라이였다. 주인한테 칭찬 받은 개처럼, 그때도 막 실실 웃었다. 사실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웃음이다. 어쩌면 그때부터, 나한테 살갑게 구는 김민규가 좋았던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
이번 영화는 못 찍겠다고 전해줘
놀랍게도 정말,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당장 주말까지 시나리오를 쥐어짜야했다. 창작의 고통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가령 주어진 대본만 연구하고 연기해내면 되는 김민규는 모른다는 말이다. 작업에 몰두해야하는 나를 방해하는 것은 항상 김민규였다.
김댕댕
[저너누]
[원우얌]
[나 심심행] PM 16:24
[치맥 콜????]
[너 안읽씹하는거 알고잇ㄷㅏ 나] PM 16:25
이번 작업은 스탭들도 이미 정해져버려 책임감이 막중했다. 무엇보다 배우가 김민규니까. 여태 써서 만들었던 것 중에 최고로 잘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진짜 잘하고 싶었다. 오, 역시 전원우! 항상 내 영화를 시사하고 칭찬해주는 김민규 목소리가 좋았다. 무작정 책상에 앉았다. 생각나는 대로 노트에 쭉 문장을 적었다. 그냥 끄적였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 온통 김민규 투성이였다. 나 얘 많이 좋아하나봐.
이상하게 봄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감기에 걸렸다. 컨디션도 좋지 않고 스트레스도 심해 매일 나를 따라오는 김민규를 피했다. 야, 전원우! 너 왜 자꾸 나 피해! 김민규가 칭얼댔다. 그래도 어쩔 수 없다. 김민규를 멀리해야 일이 마무리 될 것 같은 느낌이었다. 정작 김민규는 나한테 친구 그 이상의 어떤 마음도 없는 것 같은데 나 혼자서 헷갈리는 것 같았다. 남의 속도 모르고 살갑게 구는 김민규가 괜히 미웠다. 너 김민규랑 싸웠냐? 과방 소파에 멍하니 앉아있는데 권순영이 옆에 와 물었다. 권순영도 이번 작품에 촬영감독으로 함께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런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닌데 이래? 너네 요즘 이상해. 특히 너.”
“내가 뭐.”
“누가 보면 사랑싸움 하는 줄 알겠어.”
“야.”
내가 꽤 오랫동안 김민규를 짝사랑 해 온 것을 얘는 안다.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권순영 말로는 그냥 티가 난댄다. 그럼 김민규는 어떤 마음인 것 같냐고. 저번에 자존심 다 버리고 물었더니 또 모르겠다고 한다. 내 옆엔 좀 많이 이상한 애들 밖에 없는 것 같다.
“김민규랑 하는 작업이라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거 알어.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이 작업하는 거, 쉬운 일 아니고 더구나 그게 너라면 더 잘하고 싶어 죽을 거라는 거 너무 잘 알아.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좀. 어? 정신 차려라.”
“알았어어……”
그래도 고마운 것도 얘네 밖에 없다. 그리고 이거. 권순영이 한숨을 푹 쉬더니 주머니에서 무언가 꺼낸다. 따뜻한 쌍화탕이다. 이게 뭐야? 누가 줬는지 알 것만 같아서 입꼬리가 자꾸 실실 올라갔다.
“알면서 묻냐? 쳐웃기는… 김민규가 너 갖다주래. 하여튼 둘이 맨날 싸워도 붙어 다니지. 이게 영화지, 뭘 더 만들어야하냐?”
김민규는 사람을 헷갈리게 한다. 이러니까 내가 안 좋아할 수가 없다. 안 좋아할 수만 있다면 안 좋아하고 싶은데, 김민규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다. 내 마음이 언제 이렇게 커졌는지 알 수 없지만. 확실한건 김민규의 이런 사소한 행동들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아픈 것 같으면 약 챙겨주고, 힘들어하면 내가 좋아하는 김치볶음밥 해주기도 하고. 사실 김민규가 치대는 것을 좋아하는데 낯간지러워서 이러는거라… 아무리 밀어내도 내 옆에 딱 붙어있는 그런, 김민규가 너무 좋아져버린 거다.
김민규 생각을 너무 많이 했다. 김민규가 준 쌍화탕이 아까워서 먹지도 못했다. 식은땀이 나서 온 몸이 뜨겁고 차갑기를 반복했다. 정신이 혼미할 정도였다. 머리를 너무 많이 쓴데다가 스트레스를 받아 아픈 적이 여러 번 있긴 해도, 이렇게 심한 적은 처음이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 생각도 안 들어서 베개에 얼굴을 묻으며 끙끙 앓았다. 때마침 폰에서 요란하게 진동이 울렸다. 전화를 건게 엄마든 누구든 받아서 살려달라고 말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았다. 테이블 위를 더듬거리며 겨우 전화를 받았다.
-전원우. 내가 할 말 있다고 카톡,
“나 죽을 것 같아… 좀 와줘, 으……”
-원우야, 너 무슨 일 있어? 원우야!
반가운 김민규 목소리였다. 우리 사이 지금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뭐가 어떻게 돌아갈지 생각할 겨를 따위 없었다. 그렇게 침대를 몇 분 동안이나 뒹굴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전원우! 이제 힘이 없어서 눈도 제대로 뜰 수가 없었다. 민규야… 그런데도 흐릿하게 보이는 김민규 얼굴이 너무 반가워서 막 눈물이 났다. 흐으, 야… 나는 누워서 막 울었다. 이렇게 울어본게 얼마만인지. 제어를 할 수 없을 만큼 퐁퐁 눈물을 쏟았다.
“많이 아파? 어디가 아파? 이게 뭐야, 갑자기!”
“소리 지르지, 마, 끅.”
“울긴 왜 울어… 어떡해, 병원 가자.”
“못 움직여. 나아…”
“그럼 업혀. 얼른!”
“그냥 여기 있어…”
어쩔 줄 모르는 김민규 손을 붙잡았더니 갑자기 조용해지며 내 옆에 앉았다. 이마에 제 손등을 올려보더니 그 큰 눈을 더 동그랗게 뜨며 나를 쳐다봤다. 이렇게 될 때까지 뭐했어, 진짜… 속상해. 꼭 자기가 울 것처럼 눈이 울망울망해서, 당황했다.
“너 울어…?”
“안 울어! 약이나 먹어. 너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작업도 쉬엄쉬엄해야지, 안 그러니까 병나는 거 아니야.”
김민규는 절대 한마디도 안 진다. 꼭 우리 엄마 같다. 자기네 집인 것처럼 막 냉장고에서 물통을 꺼내고, 컵도 꺼내서는 손에 다 쥐어준다. 아픈 데에는 장사 없다. 나는 꿀떡 약을 삼키고는 다시 드러누웠다. 그래도 김민규가 와서 다행이다. 좀 좋다, 아니 많이…
그렇게 정신이 아득해진 채로 잠들었나보다. 눈을 뜨니 김민규가 내 옆에 잠들어있었다. 누가 보면 지 침대인줄 알겠어. 얼마나 가까운 건지 김민규 숨소리가 가까이 들렸고, 그 잘난 얼굴도 바로 코앞에서 구경 할 수 있었다. 지인짜 잘생겼다… 나도 모르게 손을 올려 김민규 콧등을 손가락으로 콕콕 만져봤다. 한동안 그렇게 김민규를 뚫어져라 보다가, 심장이 쿵쿵 뛰는 것을 느끼다가 문득 서운해지기 시작했다. 내가 널 얼마나 좋아하는데 몰라 주냐, 나쁜 놈아. 우리 과 뿐 아니라 학교 전체, 아니 학교 밖을 통틀어서 김민규는 인기가 너무 많고 얘를 좋아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솔직히 김민규도 내 마음과 같을 확률은 아주 희박하다고 생각했다. 어차피 이루어지지도 않을 거.
나는 약기운에 취해 버린 건지, 나도 모르게 김민규의 볼에 입술을 가져댔다. 그러니까, 뽀뽀나 입맞춤보다는 접촉사고 같은 느낌이었다. 나 이거 범죄 아닌가? 순간 너무 무서웠는데 내 입술은 이성을 따르지 못하고 본능에 의해 다시 김민규의 볼, 이번엔 거의 입술 바로 옆으로 돌진하고 있었다. 이게 나름 중독이 되네. 쪽, 입 맞추는 소리가 조금 크게 났다. 얼굴이 터질 것 같이 뜨거워서 입술을 틀어막고 반대로 등을 돌려 누웠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진짜? 내 자신을 막 욕하고 있을 때, 뒤에서 나보다 훨씬 크고 뜨거운 손이 뒤에서 넘어왔다. 그러더니 내 턱을 감싸고 부드럽게 돌렸다. 민규, 너무 놀라서 김민규 이름을 말하다가 그대로 김민규 입술이 다가오는 바람에 말이 쏙 들어가 버렸다. 예상치도 못하게 입술을 머금었다가 가르고 들어오는 것에 놀라, 김민규의 옷자락만 꼭 붙잡았다. 시간이 지나고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김민규가 내 위로 올라와 있었다. 아무래도 얼빠져있을 내 얼굴이 웃긴 건지. 김민규가 덧니를 드러내며 웃었다. 전원우, 생각보다 용감하네. 김민규 말에 나는 너무 민망해서 아무 말이나 뱉어버렸다. 이, 이번 영화는 못 찍겠다고 전해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