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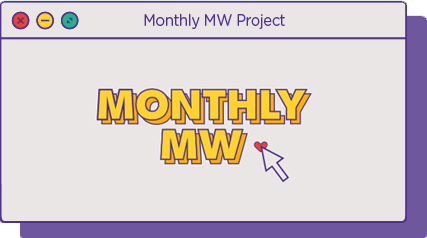
2021. 2. 20. 10:07
투명한 어항, 그리고 어항에 담긴 물에 담겨져 몸을 흔들며 헤엄치는 아름다운 색을 자랑하는 열대어들. 언젠가는 나도 저렇게 멋진 물고기를 키워보고 싶다고 마음먹었던 적이 있었다. 그냥 그 물고기들의 외면에 반하여서, 마음이 날 어느새 수족관 직원으로 만들었고 많은 물고기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 얘들아, 밥 많이 먹으렴.”
매 시간에 맞춰서 밥을 뿌려주고 아픈 물고기들을 챙기며 끼니를 거르는 것이 일상이 된 터라 굶주린 배를 둥그렇게 쓰다듬으며 자신의 일을 한다. 아 맞다, 내 이름은 전원우. 리틀 수족관의 직원이다. 가끔은 단체 손님들에게 안내를 해주기도 하고...
“열대어들은 물 온도가 25도일 때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물고기입니다. 10~15도 사이가 되면 열대어들은 온도에 예민하기에 쉽게 죽게 됩니다.”
아니면 매일 있는 공연의 안내를 다른 직원과 함께 하기도 하였다. 마이크를 차고 액션을 크게 하며 하지 말라는 것을 경고하는 것. 그것도 내 일이였다.
“공연을 보시는 도중 큰 소리를 내시며 안 돼요. 그리고 공연 중 핸드폰 촬영은 금지 하며 촬영을 하실시 핸드폰을 가져가 자료를 지울 수 있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늘 내가 하는 일은 일정하다. 어항에 갇혀 헤엄을 칠 수 없는 물고기처럼 할 수 있는 일이 한정되어 있기에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다. 어린 아이들에게 다치기도 일쑤였고 물고기를 옮기다 플라스틱 상자에 긁히기도 많이 긁혀서 팔과 손목엔 상처가 가득했다. 그래도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간단했다. 내가 이 일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나에겐 물고기란 특별해서였다.
“그럼 여러분 공연 재미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안내를 끝내고 나와 가려는데 누군가 내 손목을 잡았었다. 평소 차갑던 내 손을 따뜻하게 만들어준 그 손에 순간 놀란 나는 뒤를 돌아봤었고 내 뒤엔 어떤 남자가 한 명 서 있었다.
“저기요?... 이게 뭐하시는...”
“조용히 있어봐요.”
“네?”
나한테 갑자기 가만히 있어보라는 남자에 손목을 잡은 손을 풀어보려 노력해봤지만 힘을 엄청나게 쏟아 부어서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손목은 풀리지 않았다.
“저기요.”
“네?”
“번호 좀 주실 수 있으세요?”
갑자기 번호를 달라는 말에 당황한 나는 갑자기 무슨 번호냐고 안 된다며 선을 그었지만 그 사람은 계속 나에게 들이댔었다. 하지만 완강하게 나오는 남자에 당황한 나였다. 빨리 물고기들 보러 가야하는데... 이 생각만이 내 머리에 계속 울리고 있었다. 하지만 점점 아파오는 손목에 현실이 직시가 되었고 번호를 안 주면 안 갈 것을 잘 알기에 그랬을까 번호를 주겠다고 말을 하니 그제야 풀리는 손목이었다.
“여기 제 폰이요.”
핸드폰에 하나하나 정성들여 번호를 치자 어느새 열 한자리의 전화번호는 그 사람의 핸드폰에 남아있었고 무언가에 만족하는지 돌아간다. 원우는 놀란 마음이 진정되었는지 심장을 쓸어내리고는 다시 일에 집중하기 시작하였다. 또 다시 무한의 바퀴처럼 돌아가는 나의 일상이었다.
“반가워요.”
그리고 그 사람은 매일같이 수족관에 왔다. 내가 공연 안내하는 시간이면 늘 공연장 좌석에 앉아 있다가 내 팔목을 잡았다. 매일 지루하던 일상에 행복한 무언가가 추가된 것이다. 똑같던 일상에 지루해할 때 즈음 찾아온 그 사람의 이름은 김민규. 직업은 화가라고 한다. 영감을 받으러 수족관에 왔다 나를 보고 반해 초면에 번호를 달라고 남자, 내 뇌리에 박혀서 빠지지 않는 남자였다.
“원우형!”
“왜? 나 일 해야 해.”
“형아...”
“민규야 기다려봐. 네, 금방 갈게요!”
늘 수족관에서 만났기에 일에 치이던 나한테는 민규가 보이지 않았었다. 수족관 관리자들은 발로 뛰어다니며 물고기를 챙겨야했기에 같이 있을 시간이 적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저녁에 민규한테 전화 한 통이 온다.
‘형’
‘응?’
‘주말에 시간 돼요? 수족관 안 나가?’
‘에? 갑자기 왜?’
‘형이랑 데이트 하고 싶어요.’
‘나랑 데이트?’
‘수족관에 있음 형이 너무 바쁘잖아. 그러니 주말엔 나랑 놀아요. 나 형한테 첫 눈에 반했다고.’
그렇게 결국 주말에 만나게 된 우리다. 간단하게 영화를 한 편 보자는 말에 당연히 이정도는 괜찮겠다 싶고 허락한 나였지만 남자 둘이서 영화라... 내가 수족관 일을 시작하고 나서는 영화나 바깥 생활에 연을 끊고 살았었다. 수족관에 있는 생활이 익숙해질 때 즈음 바깥 생활은 더욱 나에게 어색하게 다가왔지만 민규는 내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나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원우형!”
“어...”
“오늘도 진짜 예뻐요.”
“이 자식아, 여기 공공장소거든?”
“아 진짜 내꺼 될 사람인데요 뭐!”
민규는 되게 솔직한 아이다. 겉모습이 매우 화려했지만 속은 솔직하며 담백한 아이, 그러면서 어딘가 매우 예민한 모습. 물고기에 비유하자면 민규는 열대어 같은 사람이었다.
“오늘 뭐 예매했어? 네가 예매한다고 했잖아.”
“형, 오늘 볼 영화는...”
아름다운 물고기들이 주로 나오는 영화를 선택한 민규. 열대지역에서 지내는 주인공의 이야기지만 물고기를 보러 간다는 사람이 더 많을 정도로 평점이 낮은 영화였지만 평소 나의 취향을 고려하여 골랐을 생각을 하니 귀여워서 웃음이 피식 나왔다. 영화가 시작되고 아름다운 물고기들이 눈앞을 휘젓는 듯 헤엄치는 그 영화를 보니 자연스레 웃음이 나왔다. 그러다 옆에 봤는데 영화에 집중하는 민규를 보며 너는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고 자연스레 생각을 하게 된다. 생각하다 아, 이거 애인들이나 하는 생각 아닌가. 왜 내가 얘한테 이런 걱정을 하고 있지 한다. 그렇게 많은 생각이 공존한 채로 영화는 끝났다.
“민규야 네가 영화에 팝콘 샀으니...”
“형, 뭔 생각을 그렇게 해요?”
“응?”
“형 지금 계속 무슨 생각 하느라 집중 못하고 있잖아.”
“아니 그게...”
“형 나 싫어요 혹시?”
“아니야!”
나는 그 때 무슨 생각을 했었기에 그 아이에게 안 싫어 라고 말했을까. 아직 호감도 사랑의 감정도 못 느낀 그 아이에게 도대체 왜 어떤 자신감으로 이 말을 했을까. 생각해봐도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 말을 했는지 아직도 모르겠다. 위기를 덮기 위해 했던 말이 더욱 일을 크게 만들어서 문제였다. 그리고 이 문제를 일으킨 난 그 뒤를 후회했다.
“형...”
“민규 너 좋아해.”
난 정말 저때 저 말을 꺼내서는 안 되었다. 전원우 인생 가장 큰 실수라고 한다면 김민규에게 싫지 않고 좋다고 말한 것. 그저 넌 나에게 손님이었을 뿐인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였는데 말이다. 그렇게 나의 발언 그 이후 나는 그 아이랑 연애를 하기 시작했다. 달달한 듯 어딘가 차가운 연애.
“형!”
“응?”
“내 마음의 온도는 몇 도 같아?”
“음... 나는 모르지?”
“내 마음의 온도는 25도래!”
늘 자신의 마음의 온도를 25도라고 말하는 민규. 25도, 열대어들이 살아가는 온도. 민규는 역시 열대어가 인간화 한 모습인걸까. 민규랑 만나는 그 내내 나는 차가울 수밖에 없었다. 내 실수에 인해 만났고 주변 사람들은 내가 애인이 생겼다고 무척이나 좋아하는 추세니 정말 힘들어도 꾹 참고 만났다. 민규는 그런 나를 눈치 챘던 것일까.
“형, 요즘 무슨 걱정 거리 있어요?”
“아니야 민규야, 아무것도 없어.”
“형 지금 나랑 눈도 안 마주치고 이야기하잖아.”
“...”
“형, 난 형 걱정하는거 듣고 공감해 줄 자신 있어. 형이 힘들면 나한테 좀 기대줘.”
이 말을 듣고 생각했다. 아 민규가 나를 정말 좋아하는 구나. 어떻게든 해서라도 빨리 정을 떼야하는 구나. 진짜 민규야 내가 나쁜 사람이 되더라도 헤어지기로 결국엔 맘먹었다. 만나는 횟수를 줄여가고 전화와 문자에도 점점 단답으로 대답하고... 노력하고 있었다. 민규에겐 미안하지만 민규의 마음속 온도가 점차 떨어지기를 그렇게 해서 내가 차이기를, 너의 눈에서 눈물을 흐르게 하는 것은 미안하지만 나부터 살아야한다고 맘먹은 이상 민규가 내 눈에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았다. 그저 살기 위해 버둥거리는 나만 보일 뿐, 그가 더 이상 들어오지 않자 민규에게서도 연락이 점차 끊기기 시작했다. 그렇게 우리 둘은 끝났다.
“하...”
민규와 그렇게 헤어진 후 죄책감에 조금이라도 녹은 내 마음속은 다시 얼었다. 조금 따뜻해진 손도 다시 얼기 시작했다. 그리고 또 다시 시작된 매일 똑같은 일상이다. 민규를 만난 뒤 겪은 변화조차 이제 없어지니 내 일도 어딘가 매우 허전했다. 그렇게 어느 날과 다름없이 또 공연 안내를 하러 가는데 늘 민규가 앉아있던 자리는 비어있었다. 도대체 내가 살기 위해 헤어진건데 왜 그 아이 생각이 나는건지... 머리를 두어번 때려봐도 그 아이 생각으로 머리가 가득찼다. 이러면 안 되는데, 도대체 왜 이러는지 우울했다.
“그럼 여러분, 공연 재미있게 보시길 바랍니다.”
늘 같은 마무리 멘트를 하고 나가려는 그 순간, 내 눈앞에는 누군가가 서 있었다. 화려한 겉, 하지만 솔직하고 담백한 그 사람. 김민규... 나는 미안해서 빨리 가려고 했다. 하지만 날라오는건 차가운 시선. 민규가 보낸 거겠지. 열대어같은 그... 열대어도 물의 온도가 25도에서 15도가 되면 죽듯 25도의 마음이 15도가 되어서 사랑이 죽은 것일까. 미안했다, 나 때문에 힘들었다면 미안했다. 내가 사랑하던 열대어를 죽인 것과 다름없었기에, 난 수족관 관리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 생각했다. 결국 사표를 냈고 나중에 이 일이 그리워진 탓 다른 수족관으로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만 난 열대어를 볼 때 마다 꼭 김민규 생각을 한다. 열대어 같이 아름다웠던 너, 내가 죽여버린 최초의 물고기. 잊지 못할 너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소주 한잔을 마신다. 잘 지낼까, 아니지 잘 지내줬음 좋겠어. 열대어 김민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