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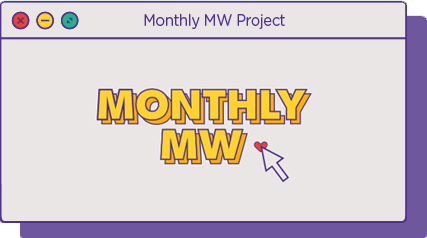
2021. 2. 20. 10:03
모든 파괴적인 것들을 사랑하였다.
살아있다는 것은 어떻게 느낄 수 있는 걸까? 나는 알 수가 없다.
눈을 감고서야 인지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쿵쿵 수면 위로 솟는 심장. 목덜미 속 동맥. 맥박. 내뱉어지는 숨. 생명. 무정형의 영혼.
감각.
본디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적었다. 자극을 찾아 헤맸다. 모든 파괴적인 것들을 사랑하였다.
타인의 비극이란 유희다.
“형, 형.”
음성은 빛처럼 스며든다. 부모조차 버린 나를 깨우는 이가 있다.
“형 또 밥 안 먹었죠.”
“엉.”
“하루 종일 누워있었어요, 또?”
“엉.”
눈을 뜨면 환히 빛나는 얼굴.
“일어나요, 밥 먹자.”
부모조차 버린 나를 챙기려 드는 애.
우리는 첫 만남에 섹스를 했고 이틀 후 통성명을 하였다.
우리가 아는 것은 서로의 이름뿐이다.
밥을 먹곤 샤워를 하였다. 좁아터진 집구석에 욕실만은 넓었다. 욕조가 두 개나 자리해야 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따금 함께 목욕을 하였다. 두 개의 욕조 안에 들어가 몸을 웅크린 채 서로를 보았다.
거울처럼.
“우린 어딘가 좀 닮았어.”
지껄이자 그 애가 소리도 없이 웃었다. 볼록 솟는 가무스름한 뺨. 미소 짓는 눈 어딘가에 슬픔이 잠겨있다는 것을 나는 안다.
그 앤 연극을 하는 학생이었다. 공연을 하고 호프집 서빙을 하고 공사판 노가다를 뛰고 귀가하여 대사를 외우다 잠이 든다. 하루 24시간을 바삐 움직이는 애. 나는 그 애 집에 얹혀살며 빈둥대는 빈대였다.
눈을 뜨면 언제나 아침이 아닌 정오다. 집 안엔 햇볕이 쏟아지고 나는 그것을 피해 구석으로 기어간다.
적막.
시계 소리가 난다.
고소한 냄새.
식탁 위를 보았다.
그 애가 차려놓고 간 아침이 놓여있다. 김치찌개. 계란 프라이. 장조림. 호박부침. 내가 좋아하는 반찬들만이.
그런 것들을 내가 말한 적이 있던가?
눈을 감으면 과거의 시간이 흐른다. 새까만 시야 속으로 인영들이 흔들린다. 양부모의 그림자이다. 고아원에서 나를 데려온. 어린 나를 끌어안고 미소 짓던 그들을 기억한다. 그로부터 시간은 물 흐르듯 흘렀다. 물처럼 잔잔하게. 안정적인 집안. 자상한 양부모의 얼굴. 나를 둘러싼 공기. 친구들. 웃음. 친절. 모든 것이 평온하였다.
그러나 열일곱의 여름 사고가 났다. 계단에서 추락한 것이다.
구급차에 실려가 머리에 붕대를 감은 채 깨어났다. 기억은 드문드문 끊기었다. 생의 여로는 곳곳이 새까맸다. 나의 태동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어릴 적의 기억. 감각. 나의 원래 이름까지도.
신체를 내려다보면 모든 게 낯설었다. 이것이 정말 내 것일까? 손은? 손톱은? 다리는? 얼굴은? 머리는?
나는 내가 아닌 것만 같다. 모든 것이 꾸며진 것 같다.
양부모는 내가 미쳐버렸다고 하였다.
ㅡ네가 제정신이야?!
벼락같은 호통이 쏟아졌다. 열여덟의 봄이었다. 밖은 따뜻한 햇볕과 홍채의 꽃잎들로 가득하고 으리으리한 저택 안 공기는 싸늘하였다. 어머니는 명문 고교의 선생에게서 호출을 받았다. 내가 장래희망에 고래 따위를 적어 넣었기 때문이었다.
쟤가 걔야? 그 또라이? 미친놈?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탄탄대로의 길만을 걸어온 꽃 같은 나의 양어머니. 그녀에게 그런 모욕은 난생 처음이었을 것이다.
ㅡ너 같은 거 데려오는 게 아니었는데.
열여덟의 봄 나는 고래가 되어 바다 깊은 곳을 누비는 꿈을 꾸며 뺨을 후려 맞았다. 오른 뺨이 얼얼하였다. 고개를 들어 정면을 응시하였다. 이윽고 모든 것이 조각났다. 정갈하던 장식장. 값비싼 예술품과 흰 벽지. 천장의 샹들리에. 눈부신 빛. 미소. 나를 감싸는 공기. 그리고 개중에 가장 눈에 띄던...
일그러진 부모의 얼굴.
그것이 좋았다.
기억을 잃어도 스스로일 수 있는 걸까? 나는 알 수가 없다. 나의 절반을 잃었는데.
주위를 둘러보면 모든 게 낯설었다. 안정적인 집안. 미소 띤 얼굴. 평온한 공기. 친구들. 웃음. 친절.
이것이 정말 내 것일까?
기억을 상실한 나는 끈 떨어진 인형이 되었다. 양부모는 실성한 나를 대신하여 양자 한 명을 더 들였다. 고요한 저녁 시간 고개를 들면 너무도 순종적인 동생의 얼굴이 보였다. 생긋 착하게 웃는. 유리 같고 가면 같은. 한 식탁 위 조종당하는 마리오네트와 끈 떨어진 인형이 음식을 씹어 삼키고 있었다.
우스운 광경이었다.
“넌 인생이 즐겁니.”
눈을 뜨면 꿈 속 과거는 흩어진다. 눈앞엔 언제나 웃고 있는 그 애의 얼굴이 있다. 그 미소에는 활력이 넘친다. 유리 같지 않고 가면 같지 않은. 부모도 재산도, 그 무엇도 없는 그 애 미소만이 인간답다. 그것이 의아해 묻는다.
“형이 있어서요.”
햇볕이 내리쬐고 바람이 나부낀다. 나뭇잎이 흔들린다. 가지 사이로 내려온 햇볕이 그 애의 눈에 닿아 빛날 때. 무언가 부서지는가? 유리구슬처럼 빛나는 그 애의 눈동자. 그 눈부신 미소에 숨이 막히었다.
“형이 살아있었잖아요.”
나의 생이 네겐 기쁨이니.
“저는 형을 (다시) 만나기 위해 숨 쉬어 왔어요.”
당연한 듯 읊조린 말은 진실일까 거짓일까?
“입 발린 말은.”
“정말이에요.”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도 쉬운 일이다. 진실인 듯 거짓을 지껄이는 이들 사이 오롯한 진심을 내보이는 애. 나를 응시하는 그 애의 얼굴은... 너무도 순진한 어린 아이 같아 나는 웃을 밖에.
우리는 그날 밤 서로를 마주본 채 웅크려 잠들었다.
태아처럼.
눈을 감으면 또다시 꿈결이다. 잃어버린 유년의 기억이 일렁이며 재생되고 있다. 암막 속에서 영사기는 돌아간다. 한낮의 놀이터 성벽 위, 나는 오롯이 햇볕을 쬐고 있다. 눈을 깜빡이었다. 태양이 쏟아졌다. 유리조각이 박힌 듯 눈이 따가웠다. 이윽고 나를 부르는 음성이 들리고, 나는 고개를 숙이어 눈알을 굴리고, 그리고 미끄럼틀 아래 어린 그 애가...
“형, 형.”
눈을 뜨면 똑같은 얼굴.
“악몽이라도 꿨어요? 왜 이렇게 땀을...”
꿈에 왜 저 애가 나오는 걸까? 본 적도 없는 유년 시절의...
“꿈에 어린 네가 나왔어.”
나를 담아내는 슬픈 눈동자.
나의 생이 기쁨이라 말하는 눈앞의 그 애는 슬픈 표정만을 짓는다.
"죽을까."
과연 삶을 축복이라 할 수 있는가.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닌, 숨이 다하기만을 기다리는 이런 생을...
"같이 죽을까."
그 애의 위에 올라탔다. 두 손으로 두터운 목을 쥐었다. 나를 물끄럼 바라보던 그 애가 눈을 감았다. 아무 말 없이 목을 내어주었다. 손끝으로 따뜻한 살갗이 맞닿았다. 그 아래 맥박이 자맥질하였다. 쿵쿵 뛰는 박동은 연약하기만 하다. 악력 두어 번에 부스러지고 말겠지. 그럼에도 나는 무얼 망설이는 걸까?
“사랑해요.”
감각.
본디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적었다. 자극을 찾아 헤맸다. 모든 파괴적인 것들을 사랑하였다.
타인의 비극이란 유희다.
“사랑해요.”
그러나 타인의 죽음을 두려워하게 된 것은 언제부터일까. 홀로 남겨질 고독을 두려워하게 된 것은 언제부터일까. 그 애 그 따뜻함에 익숙해진 나는 더 이상 힘을 줄 수가 없다. 손을 떼었다. 그 애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그 애가 내게 고백해왔다. 가없이 다정한 음성으로.
“형이 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무스름한 손으로 나의 뺨을 감싸왔다. 고개를 들어 올려 입을 맞추었다. 생명을 불어넣듯.
눈을 떠 보는 것은 그 애 떨리는 속눈썹과 희게 구겨진 이불과 어지러운 벽지와 침대 옆 탁자. 한 편의 액자 속 사진엔 어린 나와 그 애가 서있다. 서로를 끌어안은 채. 환히 웃으며.
ㅡ저는 형을 다시 만나기 위해 숨 쉬어 왔어요.
비로소 깨어진 조각은 맞추어지고
나는 마침내 숨 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암막 속에서 벗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