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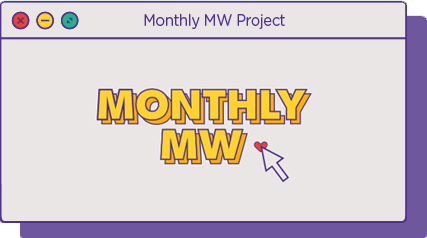
2021. 2. 15. 17:29
자신의 삶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크고 작은 결전의 순간들이 도달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포착해내곤 한다. 나는 이 어둡고 축축한 삶에 대해서도 적잖은 애착을 부리고 있는 모양이다. 김민규와 나에게는 이 새벽이 바로 그 순간이 될 게 분명했다. 하지만 그런 뚜렷한 믿음과는 다르게 마음이 정신없이 요동쳤다. 액정 앞에서 몇 분을 머뭇거리던 손가락이야말로 그런 내 망설임을 대변하는 모양새라 할 수 있는 것이었다.
[아니.]
짧은 답장을 보내자마자 문자가 도착했다. 마치 내가 답을 보내길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미끼를 던져놓고 하나라도 걸리기만 하면 바로 낚싯대를 치켜들고 싶어하는 낚시꾼처럼.
[잠깐이라도 볼 수 없을까?]
[미안. 피곤해서.]
덜컹거리는 마음들을 꾸역꾸역 욱여넣은 채, 나는 짐짓 냉랭한 기색을 가장해 답장했다. 침대에 누워 고개를 왼쪽으로 돌렸다. 시야에 들어오는 창문에는 서리가 가득 끼어있다. 몸을 웅크리고 잠을 자려는 시도에 집중했다. 물론 잠은 오지 않았다.
[그래, 잘 자.]
김민규로부터는 한참이 지나서야 답장이 왔다. 네 개 밖에 안 되는 그 글자들을 바라보다 핸드폰을 침대 아래쪽으로 던져놓고 두 팔을 머리 위로 괴어두었다. 5년 전의 일들이 서서히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 때의 일들은 지금도 내 육체와 기억을 독살스럽게 파고든다. 그리고는 흉측한 몰골이 날 때까지 끊임없이 나를 파먹는 것이다. 나는 여전히 미련함을 가득 뒤집어쓰고 그 기억에 몸뚱이를 내어준 채 소리 없이 통곡하는 것이다. 포기하고 싶은 기억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이던가. 평생이 다할 때까지 만나고 싶지 않은, 아니,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또 얼마나 외로운 일이던가.
모르는 사이에 나는 발밑의 휴대전화를 향해 내 청각의 모든 신경들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김민규에게서는 더 이상 연락이 없었다. 김민규는 내일 저녁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했다. 내일. 그 하루만 버텨내면 김민규를 만날 일이 더는 없을 것이다. 그에 관한 생각들을 하다 머리 위로 괴어두었던 팔을 이마 위로 가져왔다. 팔등으로 미열이 느껴졌다. 아무래도 지나치게 예민해진 탓이지 싶었다. 몸을 일으켜 책상 서랍을 뒤져 한국에서 가져온 종합감기약을 꺼내 입에 털어 넣었다. 생수를 사 두지 않았다는 것이 떠올라 잠시 망설였지만 뭐 어떤가 싶어 싱크대 수도를 열어 물을 손에 조금 가둔 뒤 약과 함께 삼켰다. 몇 발자국을 걸어 다시 침대로 돌아왔을 때에도 김민규로부터 연락은 없었다. 잠에 빠져든 것은 언제였는지 모를 새벽의 어느 지점에서였다.
내용이 조금도 기억나지 않는 꿈속으로 도피해 있던 정신이 돌아온 건 시끄럽게 울리는 전화벨 소리 때문이었다. 휴대전화를 진동으로 바꿔두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떠올리고는 인상을 썼다. 한 쪽 눈을 비스듬히 일으켜 액정을 확인한다. 5시 20분. 휴대전화 우측 상단의 숫자들은 내가 아직 일어날 만한 시간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다.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은 이 시간에 전화할 리가 없다. 잠든 사이에 더 올라버린 감기기운은 잠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 나를 조금 더 재우기 위해 깊숙하게 지지눌렀지만 이상한 예감 탓에 움직임이 둔한 손을 더듬어 전화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아니, 예감이라기보단 액정에 떠 있는 그 이름 때문이었던 것 같다.
“...”
“형.”
“... 어.”
“자고 있었어?”
“응.”
“내가, 깨운 거야?”
“…….”
그렇다고 대답할까 잠시 망설이다 그냥 침묵하기를 선택했다. 수화기 건너편에서도 몇 초 간 말이 없었다. 구급차인지 순찰차인지 모를 것이 사이렌을 삑삑 울리며 기숙사 앞을 지나갔다. 때마침 수화기 안에서도 같은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내가 지내는 방은 창문이 기숙사 안뜰 방향으로 나있어서 커튼을 걷고 밖을 내다보았자 김민규의 머리칼 하나 볼 수 없게 되어있다. 아무튼 너는 여기에 있고 나는 네가 여기 있다는 걸 알지. 지금은 그거면 됐다.
“…….”
“…….”
나는 수화기를 사이에 두고 일어나는 이 침묵이 너무 싫었다.
“…….”
“… 왜.”
“…….”
“전화를 걸었으면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야.”
“…….”
“이 새벽에 사람 잠 다 깨워놓고 뭐하는 짓이야, 이게.”
“… 몰랐었어.”
“뭘.”
김민규는 뭐라 말할 것처럼 ‘어’, ‘그러니까’, ‘음’ 따위의 말만 계속 반복했다. 나는 그것도 듣기 싫었다.
“할 말 없으면 끊을게.”
“아니, 형! 잠깐만! 잠깐만….”
귀에서 핸드폰을 떼어내고 붉은 종료 버튼으로 손가락을 가져가려다 말고 다시 귓가에 수화기를 붙였다.
“미안해, 형.”
“… 뭐가.”
“그때… 그때 내가 형한테 말 함부로 했던 것도 미안하고….”
“…….”
“… 몰랐던 것도 미안해.”
“뭘 몰랐는데.”
“…….”
“…….”
“사랑이었던 거.”
회로가 정지한다. 가만히 머릿속으로 기억의 경로를 재탐색한다. 5년간 뇌리에서 지워냈던 좁은 길이 조막조막 펼쳐진다. 그래, 그 날 나는 십여 년이나 알아온 절친한 동생에게 입을 맞췄고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했지. 그리고 또 어땠더라. 음, 그래, 내 앞에선 항상 웃기만 하던 그 아이가 처음으로 표정을 굳히고 나를 밀쳐낸 후 손등으로 제 입술을 박박 닦아냈지. 그리고 또, 아, 그때 그런 말도 했었다. 형은 남자잖아, 나도 남자고. 남자끼리 어떻게 입을 맞춰. 나 게이 아니야. 그 말을 듣고 내가 그랬었다.
‘네가 남자라서 좋았던 게 아니야. 그냥 너를 좋아하게 됐는데, 하필 네가 남자였을 뿐이야.’
그러자 그 아이가 이렇게 말했었던 것 같아.
‘착각한 거네, 형이. 우정인데 사랑이라고 착각한 거라고. 그런 일 흔하겠지. 사랑인데 우정으로 착각하거나 우정인데 사랑으로 착각하는 거나. 근데 형이 그런 착각에 빠질 줄은 몰랐네.’
내가 뭐라고 대답했더라. 지금 내가 널 보면서 느끼는 이 마음, 이게 사랑이 아니면 뭐가 사랑이야. 뭐 이거 비슷한 말을 했던 것 같아. 그러자 네가 그랬었지. 사랑만 아니면 뭐든 다 될 수 있다고.
김민규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후, 하고 깊게 공기를 뱉어냈다.
“잠깐만 나와주면 안 될까?”
“… 기다려.”
나는 트레이닝복 차림에 패딩만 걸쳐 입고 방에서 빠져나왔다. 우리 학교 기숙사는 5시부터 정문이 열리기 때문에 다섯시 반을 조금 넘긴 지금은 어렵지 않게 기숙사 밖으로 나설 수 있었다. 김민규는 정문 옆 벽에 기대어 서서 운동화 앞코로 보도블럭을 툭툭 치고 있었다. 슬리퍼 끌리는 소리를 내며 걸어가자 김민규가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웃었다.
“형이다.”
“…….”
“똑같네. 하나도 안 변했다.”
“너는 좀 늙었네.”
김민규는 푸스스 웃었다. 그러다 몸을 완전히 내 쪽으로 돌려 섰다. 나와 키가 비슷했던 김민규는 5년 사이에 내가 고개를 살짝 들어 올려다보아야 할 정도로 커져 있었다.
“잘 먹었나보다. 키 엄청 컸네. 몇 센티야?”
“최근엔 안 재봤는데 190 정도 되지 않을까.”
“이기적이라는 말은 너 같은 애들한테 쓰는 말이야. 그 얼굴이면 됐지, 무슨 키까지 크고 그러냐.”
“형도 크면서.”
“뭐래. 아무튼, 왜 불렀어.”
“… 있잖아.”
“…….”
“형.”
“…….”
“왜.”
“… 나는 아주 잘 살았어. 수업도 잘 듣고 밥도 잘 먹고 친구들 만나서 놀기도 하고. 나는 너무 잘 지냈어.”
“…….”
“근데 사실은 하나도 잘 지내지 못했어.”
“…….”
“형 그렇게 가 버려서.”
“…….”
“연락도 안 되고 형 행방 아는 사람도 없고.”
“…….”
“... 보고, 싶었고.”
“…….”
“윤주랑은 헤어졌어. 내가 뻥 차였지.”
“왜 헤어져.”
“이유 알면 놀랄 건데.”
내 고백이 단칼에 산산조각 나자마자 김민규에게 여자친구가 생겼다. 나도 아는 사람이었다. 한 학번 아래 후배인 윤주였다. 건너건너 듣기로는 꽤 오래 만나고 있다고 했다. 그래, 우리는 서로 다르니까. 나는 김민규를 사랑할 수도 있는 사람이지만 김민규는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절친한 형동생 사이 하나가 무너진 것,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지 싶었다.
“자는데, 윤주랑 자는데, 형 이름을 불렀어.”
“… 뭐?”
그 순간 나는 나와 김민규를 제외한 모든 사물들이 정지해 있는 세상 속에 놓인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김민규는 굳은 내 얼굴을 보다 고개를 푹 숙였다.
“알아, 이제 와서 이러는 거 웃긴 거 아는데….”
“…….”
“근데… 이제야 알겠어서….”
“…….”
“이게 사랑이 아니면 뭐도 될 수 없다는 거, 그걸 이제야 알겠어서.”
나는 김민규가 말을 끝내자마자 발꿈치를 들어 양 팔로 김민규의 목을 감싸 안은 채 입을 맞췄다. 김민규는 당황하지도 않고 내 허리춤을 바짝 당겨 안으며 혀를 얽혀왔다. 길지 않은 키스를 끝내고 나서도 우리는 몇 번이고 짧은 입맞춤을 나눴다. 사랑한다는 말을 가없이 쏟아내면서. 우리는 사랑이 아니면 무엇도 될 수가 없다는 확신을 공유하면서.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이 되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