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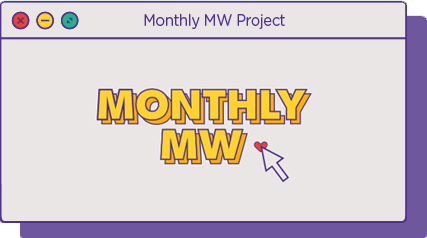
2021. 2. 15. 17:29
흔히 말하는 동화책 같았던 우리의 시작은 여름 장마가 시작되던 날이었다. 미치도록 더운 날에 내린 비는 한줄기에 빛과도 같았다. 그리고 너도 나에게 한줄기의 빛이었다.
*
'솨아아'
종례시간에 내렸던 비는 곧 밝았던 교실 분위기를 어수선하게 만들었고, 곧이어 들리는 익숙한 목소리는 담임선생님의 목소리였다.
"오늘 야자 째는 애들은 각오해라"
원우는 우산도 없는대 야자라고 하니 괜히 마음이 갑갑해졌다. 야자가 끝나고 어두운 빗길을 해쳐나갈 생각에 괜히 소름이 돋는 원우였다.
시간이 지나 야자가 끝나고 원우는 학교를 나섰다. 우산이 없어 무작정 뛰어봤지만 교복과 가방은 이미 젖은 상태였다. 원우는 다 포기하고, 걸어가기 시작했다. 학교와 집은 꽤나 멀었다. 걸어도 걸어도 끝이 안 보이는 빗길이었다. 심지어 안경은 비에 젖어 앞이 안 보일 정도였다. 곳곳에 보이는 가로등은 원우를 비췄고, 그림자로 보이는 원우의 모습은 쳐져 있었다.
오랫동안 맞은 비에 원우는 점점 추워지기 시작했다. 손을 모아 입김을 불며 걸어가고 있는 원우 뒤로 커다란 그림자가 그려졌고, 우산이 씌워졌다. 김민규였다. 민규는 우산을 원우에게 쥐어줬고, 자신의 외투를 벗어 원우에게 걸쳐줬다. 외투 주머니 안에는 핫팩이 들어있었다.
"선배, 다음부턴 나 불러요."
드라마나 영화 명대사 같았던 그 말은 원우의 볼을 밝혔다. 그게 우리의 시작이었다. 비 그리고, 당신.
장마 주기였던, 그 주에는 하필 시험기간이었다. 필수였던 야자와, 야속하게 내리는 비는 우리를 놀리는 듯했다. 그러나 우산을 같이 쓰고 하교하는 우리는 조금 특별한 사이가 되었다. 남들보다 더 특별한 사이.
그러던 어느 날 장마 주기가 끝난다는 기사가 떴다. 날씨를 확인해보니 구름이 서서히 없어지는 듯했다. 다시 무더운 여름이 찾아오는 것 같았다. 원우는 생각했다. 이제 민규와 우산 쓸 일은 없겠구나 라고.
비가 오는 마지막 밤,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우산을 쓰고 집에 가는 길에 민규의 발걸음이 가로등 밑에서 점쳐졌다.
"선배 나 이제 무슨 변명으로 형 만날까요...?"
민규는 시무룩한듯 원우를 보았다. 그렇다 민규는 비를 변명으로 원우 곁을 지켰었다. 원우는 이걸 자신에게 물어본 민규가 귀엽게 느껴져 피식 웃었다.
"선배 방금 웃었어요? 난 엄청 심각하단 말이야.."
발끈하는 민규였지만 웃는 원우를 보고 금세 따라 웃는 민규였다. 원우는 집을 들어가기 전에 민규를 보며 말했다.
"... 변명 필요 없어. 그냥 만나도 돼.."
부끄러운 듯 큼 큼 거리다가 괜히 손으로 내려간 안경은 짓누르더니 집으로 들어간 원우였다. 민규는 그날부터 원우 옆을 지키게 되었다.
*
"요번 시험은 조별과제로 하겠습니다. 주제는 ‘비’로 하겠습니다. 조원은 뒤에 붙여놓겠습니다."
신입생이 들어오자마자 시작된 지옥의 조별과제는 말 그대로 지옥이었다. 참여 안 하는 사람은 물론 돼도 안 되는 이유 갖고 안 나오는 사람까지 다들 ppt에서 이름을 빼버리고 싶었다.
[1조 김민규 전원우 김상훈 이설아]
졸졸 따라다니다가 원우가 졸업하니까 똑같은 대학 들어가겠다고, 고3 때 연락이 끊긴 민규는 신입생 오티 때 찾아볼 수 있었다.
대학생이 되더니 늘름해지고 그새 키가 더 큰듯해 보였다. 민규는 저 멀리 복도에서 손을 흔들었다. 안 그래도 키가 커서 잘 보이는 민규였지만 자신만 모르는 듯했다. 그렇게 다시 만난 둘이었다. 알고 지낸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선배 선배 하는 민규에게 원우는 말했다.
"언제 적 선배야 형이라고 불러 그냥"
민규는 입을 손으로 틀어막으며 감격을 먹은듯했다. 그렇게 시작된 조별과제는 생각보다 수월하게 진행됐다. 물론 원우와 민규 둘이서만. 선배라는 사람들은 조별과제를 하는 기간 동안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원우가 조장을 맡았고, 민규가 ppt를 만들었다. 둘은 카페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 카페는 마치 그 둘의 관계처럼 평화로웠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았고, 잔잔한 노래가 깔렸다.
조별과제 주제가 ‘비‘ 였기 때문에 민규와 원우는 과거를 회상하였다.
“빗길에서 네가 뛰어오던 게 엊그제 같았는데..”
원우는 노트북에 비의 종류를 쳐 보며 말했다.
“흔히 여름철에 단시간에 굵은 빗방울을 동반하는 비를 소나기라고 말한대”
“그 비도 소나기였죠?”
“어 그럴 거야 아마도?”
그 들의 추억이 담긴 비는 소나기였다. 추억에 잠긴 그 들은 시원한 소나기처럼 잠깐 스쳐가는 추억이 되었다. 왠지 모르게 비라는 날씨가 좋아지기 시작한 둘이었다. 둘이 추억에서 현실로 돌아왔을 때쯤엔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주룩주룩 또는 솨아아. 2년 전 그날과 같았다. 비 그리고 당신. 민규는 비와 어울렸다. 그리고, 민규는 마치 비인 마냥 원우에게 다가왔다. 그 들에게 주어진 우산은 한 개였고, 그 우산을 같이 쓴 둘이었다. 원우는 민규가 제법 커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그 좁은 우산 안에선 둘의 숨소리와 빗소리만 들렸다.
그날 이후로 둘은 남들이 보면 조금 이상한 사이가 되어버린다. 민규는 원우를 만나러 가는 시간은 칼같이 지켰고, 비가 오는 날이면 늘 데리러 갔다. 그런 날이 계속되었고, 결정적인 날이 있었다.
그 날은 무슨 일 때문인진 몰라도 원우와 민규가 싸웠던 날이었다. 그리곤 원우는 도서관에 갔었다. 원우는 평소에 책에 관심이 많아, 책을 빌리러 자주 도서관에 갔었다. 원우가 도서관에서 책을 골라 읽고 있을 때쯤 창밖으론 비가 내리고 있었다.
이어폰을 꼽고 있었던 원우는 창밖에 내리는 비를 보곤 민규 생각이 문득 들었다. 하지만 원우는 금세 책을 읽었다. 책을 읽다 보니 하늘은 금세 어두워져 있었다.
원우는 빗속으로 손을 넣었고, 원우의 손은 금세 비로 인해 축축해졌다. 당장이라도 민규를 부르고 싶었지만, 괜한 자존심 때문에 민규를 부르지 않았다.
원우는 그렇게 어두운 빗속을 뛰었다. 야속히 내린 비는 금세 원우를 적셨다. 그 시간 민규는 문자 한 통을 보게 된다.
‘전원우 지금 도서관 근처 빗길에서 뛰어가던데 너네 싸웠냐?’
민규는 문자를 보고선 답장도 하지 않고, 바로 우산을 챙겨 집을 나섰다. 민규의 집이랑 도서관은 거리가 꽤 있었다. 도서관으로 가는 길엔 원우한테 계속 전화를 걸었다.
원우의 휴대폰은 젖어 안 켜진 지 오래였다. 민규는 다급해져 뛰기 시작했다. 더운 여름이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입이 떨리기 시작한 원우였다. 차가운 소나기 그리고, 우산도 없이 빗속을 걷고 있는 원우, 원우를 찾아 뛰는 민규. 몇 년 전 그날과 비슷했다. 조금 성숙해진 그 들은 비슷한 일을 겪고 있었다. 그리고 끝내 민규는 원우를 찾았다. 원우의 모습은 물에 빠진 고양이 마냥 젖어있었다. 뛰어온 민규는 숨을 거칠게 쉬며 원우를 안았고, 민규의 심장소리를 들은 원우였다. 그리곤, 민규는 우산을 쥐어주며, 외투를 벗어줬다. 반복되는 루트였다.
이 더운 날 핫팩은 어디서 구했는지 주머니 안은 핫팩의 온기로 따듯해졌다. 원우는 뛰어온 민규의 머리 위에 손을 올려 머리에 있는 물기를 털어줬다. 우산을 쓰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민규의 머리에는 물방울이 송골송골 맺혀있었다.민규와 원우의 사이에선 어색함의 침묵이 돌았다. 그 침묵을 먼저 깬 건 민규였다.
“형, 저랑 사귈래요?”
분명 그 분위기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이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상상을 초월한 민규였다. 원우는 당황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형은 나 없으면 안 될 거 같은데.”
맞는 말 이긴 했다. 그래서 아무 말도 못 하였던 것 같다. 그제야 깨닫게 되는 원우였다.
“맞아. 난 너 없인 안돼. 그래 사귀자.”
원우는 비를 맞아 추워서 그런지 떨려서 인지 모르게 말이 떨렸다. 민규는 원우의 앞을 막았다. 환한 가로등 밑에 서있는 둘이었다.
“이 날만 3년을 기다렸어요.”
이 말을 끝으로 둘의 입술이 포개어졌다. 쓰고 있던 우산은 떨어졌고, 빗방울은 하나둘씩 떨어졌다. 가로등에 비친 둘의 모습은 동화책에서만 나올법했다.
원우에겐 빗소리가 들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생겼다. 그 길을 지나치는 날이면 그리고 비가 내리는 날이면 괜히 기분이 들떠지는 둘 이였다.
*
늘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동화책처럼 우리도 동화책 같은 끝과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었다. 몇 년이 지난 지금도 늘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내리는 비는 아직도 나 자신을 설레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