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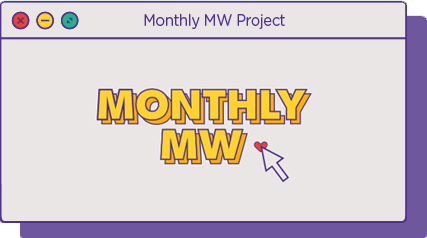
2021. 2. 15. 17:24
새싹이 자라나서 봉우리를 맺고 꽃이 피고 지듯이, 사랑도 자라나서 한껏 피고 다시 진다. 이는 우리가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이다. '봄에 새싹이 트고 여름에 활짝 피듯이, 가을에 지기 시작하고 겨울에 끝난다'는 것은, 사랑이 그렇다는 뜻이니까. 그리고 이 추운 겨울에도 불타오르던 우리의 사랑이 끝날 리 없다고 생각했던 우리들은, 이제 봄에 가까워져서야 가을이 찾아왔다고 생각한다.
이별은 불가항력
김민규는 처음 전원우를 봤던 날이 흐릿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기억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아니다. 어떻게 알게 됐더라, 대학교 도서관이었나? 조별과제 때문이었나? 뭐 어떻게 만났는지가 중요한지는 모르겠다.
중요한 것은 다른 것들도 흐릿하다는 거다. 원우의 생일과 둘이 만난 날, 이 둘은 절대 잊을 리 없다고 자부했었다. 그게 화근이었다. 핸드폰 비밀번호가 그렇게 조합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가끔씩 그게 흐릿해서 핸드폰 비밀번호를 못 푼다. 한참 뒤에 생각나서 폰을 열면 쏟아지는 원우의 무슨 일 있냐는 문자에, 비밀번호를 잊어버려서 연락 못 했다고는 절대 말하지 못한다. 원우는 민규 비밀번호를 알고, 원우 비밀번호 또한 민규 생일과 처음 만난 날이니까. 나랑 똑같은 건데 나만 잊어버시면 좀 그렇지 않은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할 짓이 못 된다고 생각한다. 또 익숙하게 달력을 꺼내 예쁘게 꾸며놓은 날짜를 찾았다.
오늘도 민규에게는 연락이 오지 않았다. 쓸데없이 눈치가 빨라서 그 이유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헤어지자고 말할 기회를 잡으려는데 고작 비밀번호 하나 못 풀어서 못 헤어진다는건 좀 짜증난다. 차라리 비밀번호 힌트 칸에다가 비밀번호를 적으라고. 아니면 바꾸던가. 이젠 좋아하지도 않는 사이인데 굳이 그 비밀번호를 고집하는 이유가 뭐냐고.
11월 17일에 내 번호를 따간 남자가 학교 후배라는 것을 알았을 때가 23일이었다. 홧김에 그냥 사귀자고 해버렸는데 그게 대학을 졸업한 지금까지 한 4년 정도 이어진 것 같다. 돌아보면 참 이상한 연애였다. 사랑하다가도 엄청 싸우고, 싸워도 정신차리면 화해해 있고. 사귄지 1년도 안 된 애인을, 좋아해서 사귄 것도 아닌 애를 2년이나 기다려준 나도 참 신기하다. 같이 있었던 시간이 행복하고 좋았지만 딱 그뿐이었다. 지금은 권태기가 온 건지 처음부터 이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다. 민규야, 이번 주말에 영화보러 갈까? 바로 보지 않을거라 예상했는데 금방 1이 사라졌다. 핸드폰 보고 있었나? 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은 그는 답장을 기다렸다.
왜 읽고 씹어 민규야? 무슨 일 있어? 읽은지 꽤 지났는데 답이 없는 민규에 손이 바삐 움직였다. 바쁜가? 한가하다 했는데. 한 살 어린 후배에게 무시당한 기분이 그리 좋지는 않았다. 뭐야 얘, 설마 이젠 나랑 연락도 하기 싫다는 건가? 아니면 내 존재도 잊어버렸나? 그래도 마지막인데 굳이 그래야 했나 싶어서 좀 서운했을 때였다.
[형 미안ㅠㅠㅠ 갑자기 아빠가 찾아와서ㅠㅠ...]
[그리고 주말에 영화 말인데 못 볼거 같아ㅠㅠ]
주말 약속이 있는건가? 평소 눈치가 빠른 편이 아닌 민규가 자신의 의도를 눈치챘을 리 없다. 눈치챘다고 해도 오히려 만나서 끝내려 하지 않을까?
아니면, 얼굴 보기가 싫은가? 작별 인사만 안했지 연락만 하는 구애인이나 다름없으니 그럴 만도 했다. 그럼 그냥 톡으로 말해야겠다. 잠깐 얘기 좀 하자는 말을 대화창에 띄워 보냈다. 지금은 안될 것 같다고? 아버님이 아직 안 가셨나? 잠깐이면 된다고 했지만 이젠 보지도 않는다. 이렇게 해서는 어느 세월에 헤어지려나. 책상 옆에 있는 식물들이 다 져버렸다. 민규가 준 거였는데. 활짝 피었을 때 정말 예뻤는데, 명이 다했나보네. 그 옆에 놓여진 액자에 다정하게 입맞추고 있는 민규와 원우의 모습이 예뻤다. 눈물나리만큼, 아름다웠다. 문득 생각이 들었다. 꼭 헤어져야 하나?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정말 생각보다 괜찮은 연애였다. 과에서 가장 유명한 CC로 지낸 것도 생각보다 괜찮았고, 군대 다녀와도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으니 좋았다. 이 관계에 익숙해진 건지, 헤어져야 할까 생각이 들었다.
헤어져야지. 내 생일도 잊어버릴 정도로 마음이 없어진 너, 처음부터 홧김에 사귀었던 나. 그런거 치고는 4년이나 사귀었으니까. 나는 이렇게 좋은 사람이랑 더 이상 사귀면 안된다. 열린 문 틈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이 시렸다. 액자는, 나도 모르는 사이 엎어졌다.
민규는 오랜만에 비밀번호가 바로 생각나서 원우의 연락을 바로 받았다. 만나자. 요즘 민규가 가장 무서워하는 말은 저 말이었다. 왠지 헤어지자고 할 것 같다. 눈치가 아니라 감이었다. 요즘 원우의 행동은 사랑이라는 이름의 우정이었다. 스킨십도 피하고 사랑한다고도 안한다.
사실 원우가 사귀자고 한 게 어쩌다 나온 말임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원우는 지금껏 사랑한다고 많이 말해줬다.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믿었다. 자꾸 그렇지 않은 것처럼 구는 원우가 얄미웠다. 그동안 나만 사랑했던 거 아니잖아. 하고 싶은 말은 많았다. 할 수가 없었다.
민규에게 원우는 단단하지만 곧 부서질 것 같은 벽이었다. 조금만 더 같이 있어주면 벽을 부술 수 있을 텐데. 난 형이 아직 좋았다. 자꾸 잊어버리는 것은 얼마 안 가서 괜찮아질 거다. 한 번도 내가 형을 사랑하는 것을 잊은 적 없다. 헤어지고 싶지 않다. 우ㅕㄴ우게ㅔ 다시 연락이 왔을 때는 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식탁 옆에 보관된 원우가 준 말린 꽃은, 이젠 손을 대기만 해도 바스라질 것 같아 민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
- 헤어지자.
억장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다. 민규는 환청을 들었다고 생각했다. 그렇지 않고서야 원우가 그럴 리 없으니까. 정말 이 말만은 듣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내가 뭐 잘못했어 형? 내가 고칠게. 헤어지지 말자 우리. 눈가에서 눈물이 흘렀다. 원우는 내 눈을 마주치지 않고 말했드. 고칠 필요 없어. 우리 헤어질 때가 온 것 같아. 민규의 눈물이 원우의 억장을 무너뜨렸다. 왜 나같은 사람한테 그래? 널 좋아하지도 않았던 사람한테.
- 사랑한다며...
- 어쩌면 처음부터 아니었을지도 몰라. 너는 나에 대해서 기억도 못하잖아? 우리 끝은 여기야.
끝은 여기야. 너무 아픈 말이었다. 정말 왜 그러는데. 민규도 원우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유독 추운 날이었다.


